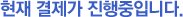- DAY06. 필담 나누는 사이
- EDIT BY 재인 | 2023. 11. 2| VIEW : 332
이상하게 손글씨는 목소리와 비슷한 면이 있어서 소리로 재생된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느 때처럼 혼자다. 엄마, 아빠는 나보다 먼저 일터로 향했고 밤 사이 방을 채운 눅눅한 공기만 내 곁을 맴돌고 있다. 창문을 활짝 열어 차가운 공기를 불러들이며 생각한다. 엄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잠에 대해.
냉장고에 토마토 쥬스 있어.
곤드레 나물밥 간장에 비벼 먹어.
재인 도시락에 챙겨. 다이어트에 좋음.
재인님. 이름으로 불리는 건 기분 좋은 일. 구달 점장님의 목소리가 들린다. 내가 모은 점장님의 메모에 가장 자주 쓰인 단어는 내 이름이다. 우리는 노트북에 있는 메모장을 통해 다음 근무자에게 한 주의 인수인계할 내용을 정리해 두는데 간식에 붙이는 메모는 예외다. 2년 반 동안 모은 점장님의 손글씨가 스물다섯 장 정도 된다. 몇 개는 책갈피로 썼으니 아마 더 많은 메모를 받았을 것이다. 그중에 가장 좋아하는 메모 세 개가 있다. 첫 번째는 ‘호랭이 2022 기운’이라는 글씨 아래 호랑이 얼굴을 그려 넣은 메모. 2022년 첫 근무 날 감자칩과 함께 받은 메모다. 두 번째는 겨울 차림새로 선물을 든 캐릭터가 그려진 ‘Merry X-MAS’ 메모. 크리스마스 시즌은 유독 우리가 서로에게 간식을 자주 선물하는 기간이다. 마지막은 코로나를 앓고 돌아온 날 홍삼과 함께 나를 기다리던 메모, ‘재인님 건강 챙겨유!’ 한동안 점장님의 인스타를 뒤져 빌보(점장님의 반려견)와 함께 있는 모습을 그리는데 푹 빠져 지냈다. 일명 메모 아트. 그러면 점장님은 단번에 그게 어떤 사진인지를 알아맞히고, 기쁜 목소리가 들리는 코멘트를 남기셨다. 생각해 보니 메모가 뜸했구나. 이번 주는 나도 내 목소리를 남기고 퇴근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