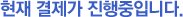![]() 어떤 동네는 카페로 기억된다. 나에겐 종로구 사직동이 그렇다. 사직동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떠오르는 건 그 지역의 지형과 거리 풍경, 유동 인구나 버스 정류장 위치 같은 정보가 아니다. 녹슨 간판과 나무 바닥이 삐걱대는 소리, 코끝을 감싸는 커피 향으로 채워지는 풍경이다. 내가 아는 사직동의 카페는 한 곳뿐이다. ‘커피한잔.’ 2005년, 북촌 계동에 처음 문을 열어 18년간 두 번의 자리를 옮기며 이곳에 정착한 작은 로스터리 카페다. 숯불로 커피를 볶는 방식과 빈티지풍의 인테리어로 알려져 오랜 시간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어떤 동네는 카페로 기억된다. 나에겐 종로구 사직동이 그렇다. 사직동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떠오르는 건 그 지역의 지형과 거리 풍경, 유동 인구나 버스 정류장 위치 같은 정보가 아니다. 녹슨 간판과 나무 바닥이 삐걱대는 소리, 코끝을 감싸는 커피 향으로 채워지는 풍경이다. 내가 아는 사직동의 카페는 한 곳뿐이다. ‘커피한잔.’ 2005년, 북촌 계동에 처음 문을 열어 18년간 두 번의 자리를 옮기며 이곳에 정착한 작은 로스터리 카페다. 숯불로 커피를 볶는 방식과 빈티지풍의 인테리어로 알려져 오랜 시간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여기가 행정구역상 사직동이 아닌 필운동에 속한다는 것이다. 바로 옆에서 인도 짜이를 파는 ‘사직동 그 가게’가 사직동 1-7번지인데 반해, 커피한잔은 필운동 130-11번지다. 지도를 보면 정확히 커피한잔부터 그 북쪽 방면으로 필운동이 시작되니, 도로명주소에 ‘사직로’가 들어간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거다. 이 사실을 알고서 몇 년간 상호를 ‘사직동 커피한잔’으로 알고 살던 나는 적잖이 혼란스러웠다.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건만, 뭐랄까, 팥 없는 붕어빵이나 고추장 없는 전주비빔밥, 홍철 없는 홍철 팀처럼 어색했달까. 왜 사직동에 커피한잔이 없는데! 아무렴 어떤가. 사직동이든 필운동이든 안 헤매고 잘 찾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을. 경복궁역 1번 출구를 나와 사직단을 좌측에 끼고 걸어 올라가는 골목길, 종로도서관과 배화여대까지 포함하는 이 지역 일대로 범위를 크게 넓혀봐도 여전히 내 마음에는 커피한잔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이 역시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
오랜만에 카페를 찾았다. 지난여름 이후로 4개월 만이다. 일 때문에 찬바람을 맞으며 줄곧 바깥을 돌아다녔더니 몹시 춥고 지친 상태였다. 나는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로 돌아와 외투를 벗었다. 먼저 미지근한 물 한 모금으로 목을 축였다. 고개를 돌려 새삼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자니 가게 안을 감도는 온기에 조금씩 몸이 나른해진다.
그때 깨달았다. 커피한잔은 동절기에 와야 하는 카페라는 걸. 이 한결같은 아늑함이 주는 행복을 더 진하게 누리고 싶다면 말이다. 어떤 회사원 아저씨는 맥주를 맛있게 먹기 위해 퇴근 3시간 전부터 물도 입에 대지 않는다고 했다. 나에게 커피한잔을 즐기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세찬 바람이 불거나 눈발이 날리는 날, 밖에서 못 해도 2-30분은 걷다가 들어오는 것이다. 그리고 따뜻한 핸드드립 커피 한 잔을 주문하는 거지. 채 가시지 않은 추위를 달래며 몇 분 앉아 있다 보면 즐거운 착각에 빠질지도 모른다. 서울 도심이 아니라 어디 외딴곳의 산장에 와 있는 것 같다고. 언제나 묵묵히 커피를 볶으며, 멀리서 찾아온 이들에게 말없이 잔을 건네는 주인장이 사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바깥세상과 잠시 분리되는 듯한 감각을 느끼게 되는 그런 곳.
![]()
![]()
그 산장은, 아니 이 카페는 절대 세련된 공간이 아니다. 따뜻함을 넘어 투박하다 못해 촌스러운 구석까지 있다. 천장과 벽, 테이블과 의자를 이루는 나무는 얼마나 오래됐는지 군데군데 긁히고 패인 흔적이 눈에 띈다. 서로 다른 색과 무늬를 가진 목재를 뻔뻔하게 덧대 놓은 부분이나 밟을 때마다 은은하게 삐걱거리는 바닥, 매끈한 최신형 로스터기와 비교되는 낡은 자체 제작 숯불 로스터기는 또 어떻고. 게다가 여기는 내가 다녀본 카페 중 잡동사니가 가장 많다. 눈에 보이는 요소들을 어떤 콘셉트나 스타일로 이름 붙여야 할지 좀처럼 감이 오지 않는다. 초록색 꽃무늬 방석과 빨간 자개 화장대, 빼곡한 LP 컬렉션과 구슬동자 장난감, 아프리카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액자와 천장에 매달린 통기타가 한데 모인 이 광경을 당신이라면 어떤 용어로 칭할 것인가.
![]()
![]()
그럴듯한 말을 찾지 못한 나는 겨우 ‘자연스러움’이란 단어를 빌려온다. 전부 다 제멋대로지만, 전부 다 원래 거기 있었다는 듯 아무렇지 않게 카페의 풍경을 이룬다. 애써 보여주려는 것도 애써 숨기려는 것도 없이. 힙하고 세련된 상업 공간을 다니다 보면 문득 지겨운 순간이 찾아온다. 너무 조급해 보이는 게 느껴질 때. 요만큼이라도 “감도”가 떨어지거나 “톤 앤드 매너”에 맞지 않는 것은 눈앞에서 치워야 한다는 강박에, “브랜딩”에 적합한 것들만 살려두겠다는 인위적인 냉혹함에 이따금 멀미가 난다. 그런 곳들을 재방문하지 않는 건 좀처럼 공간에 정을 붙이지 못해서다. 정이 안 가는 건 브랜드와 콘셉트와 그래픽 디자인과 굿즈는 보여도 이 카페를 만든 사람의 이야기와 시간은 보이지 않아서겠지.
![]()
![]()
![]()
커피한잔의 잡스러움(?)은 정확히 그 대척점에 있다. 이 가게를 채우는 대부분의 가구와 물건들은 이형춘 대표가 동네에 버려진 걸 주워 왔거나 직접 제작한 것들이다. 그에게 낡고 닳은 자국들은 심각한 하자가 아닌 사람의 손때이자 세월의 흔적으로 다가왔던 걸까. 그때그때 가져다 놓았을 법한 크고 작은 물건들을 보고 있으면 마냥 궁금해진다. 이런 의자는 대체 어디서 가져왔을꼬. 저 빈티지 머그잔은 요즘 보기 힘들던데. 이 자개장은 엄마뻘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하시겠어. 그러니까 커피한잔에 올 때마다 나도 모르게 쉴 새 없이 주변을 둘러보게 되는 것이다. 이곳에 축적된 시간을 상상하고 유추하면서. 규칙과 질서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이 투박한 카페가 또렷한 인상을 남기는 건 그 때문일 것이다. 차곡차곡 쌓이는 시간이란 얼마나 귀엽고 따뜻한 것인지 체감하고 싶을 때마다 나는 커피한잔으로 간다.
![]()
커피한잔 방문 후기를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다. ‘사람 냄새 나는 카페’. 이 모호하기 짝이 없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이제 안다.
![]()
덧. 이날 나는 ‘에티오피아 반코 고티티'라는 이름의 원두로 내어준 핸드드립 커피를 마셨다. 실키한 질감에 복숭아가 연상되는 화사한 단맛이 일품이었다. 숯불로 원두를 볶는 과정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라던데, 15년의 내공이 여실히 느껴졌다. 깊고 진한 맛을 강조하는 프렌치 로스팅과 밝고 화려한 향미를 살리는 라이트 로스팅 모두 제공하니 취향껏 골라 보시길.